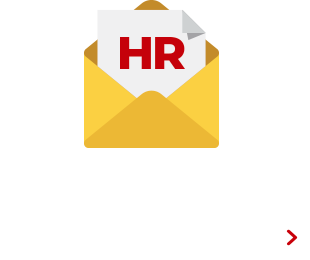봄철이 다가오면, 필자는 항상 밀크티 한 잔과 함께 마멀레이드를 곁들인 버터 바른 토스트를 먹는다. 보통 마멀레이드와 오렌지 잼이라는 단어는 서로 상호호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명확하게 따지자면 둘 사이에는 확실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잼은 좀 더 얇고 통과일이 아닌 과일의 즙을 끓여서 만든다. 이에 반해, 마멀레이드는 과일의 과육과 껍질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과일의 과즙과 껍질을 설탕과 함께 부드러워질 때까지 물에 끓여서 만든다. 껍질은 쓴 맛을 지니고 있다. 마멀레이드(Marmalade)라는 단어는 포르투갈어인 ‘Marmaleda’에서 따왔다. ‘Marmaleda’라는 단어는 포르투갈어로 ‘노란 반죽’이라는 뜻이고 ‘Marmelo’는 모과를 뜻한다. 따라서 영어로 이 단어가 그대로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는 마멀레이드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마멀레이드는 전통적으로는 10세기 경, 무어인들이 스페인에 들여온 세빌 오렌지(Seville Orange)로 만들었다고 한다. 18세기 중반, 세빌 오렌지를 운반하던 스페인 항선이 폭풍을 만나 스코틀랜드 동부의 던디지방의 항구에 피신하게 됐다. 이때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화물들은 제임스 케일러(James Keiller)라는 상인에게 팔렸다. 제임스의 어머니는 쓴 오렌지로 마멀레이드를 만들었고 이를 잼과 제과를 파는 아들의 가게에서 팔기 시작했다. 하나 알아 둬야 할 점은 비슷한 제조법이 이미 17세기에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케일러와 그의 어머니는 이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멀레이드를 상용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스코틀랜드는 유명한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장으로 인해 골프의 고향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던디지역 만큼은 스코틀랜드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자 원조 마멀레이드의 고장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세빌 오렌지는 영국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만드데 있어서 중요하다. 펙틴(Pectin)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수확량도 많고 잼을 만들기에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이 품종의 오렌지는 세비야에서 생산돼 영국으로 운반됐다. 재밌는 사실은 정작 세비야가 속한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는 이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빌 오렌지는 생으로 먹으면 신 맛이 강한데, 이 신 맛은 펙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품종의 특성 때문이다.
만약 잉글랜드를 방문해 마멀레이드를 찾았다면, 그 마멀레이드는 세빌 오렌지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때 19세기에는 스코틀랜드인들이 달콤쌉싸름한 마멀레이드를 아침에 먹는 것을 본 잉글랜드인들이 저녁에는 마멀레이드 먹는 것을 금지했다고 한다. 스페인의 오렌지를 자신들의 음식에 사용하는 점도 그렇고 영국의 특이한 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찌됐건, 이 끈적한 시트러스 잼은 페스티벌, 대회, 보드카, 심지어 국정주간까지 가지고 있다. 전통을 고수하는 편인 필자는 마멀레이드에 다른 향이나 술, 위스키를 넣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슈퍼마켓에서 마멀레이드 재료를 고를 때는 두툼한 조각으로 된 껍질보다는 얇은 가닥 형태의 껍질을 선호한다. 재료나 조리법에 상관없이 필자는 마멀레이드가 ‘병 안의 아침 알람’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멀레이드를 좋아한다.
다음 호에서는 마멀레이드에 대해 알아보는 여정을 이어가면서 마멀레이드와 던디 케이크(Dundee Cake)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미셸 이경란
MPS 스마트쿠키 연구소 대표
Univ. of Massachusetts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오랫동안 제과 분야에서 일해 왔다. 대한민국 최초 쿠키아티스트이자 음식문화평론가로서 활동 중이며 현재 MPS 스마트쿠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