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umn_ 노혜영 기자의 세상보기] 태양은 지고, 다시 뜬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테이블 34가 문을 닫았다. 간간이 테이블 34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아쉬움보다는 호텔 전체 리뉴얼 공사를 위한 잠시의 휴식일 것이라 생각해 왔던 터라, 새로운 모습의 근사한 프렌치 공간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의 끈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호텔에 프렌치 레스토랑이 하나 둘 사라져 갈 때도 굳건히 지키고 있던 테이블 34인데 17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큰 충격을 줬다. 테이블 34는 31년 전 호텔 오픈 당시 바론즈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프렌치 레스토랑이다. 오랜 경력의 프랑스 셰프들이 상주했으며 진귀한 재료로 만든 음식과 와인, 화려한 스킬을 선보이는 파인다이닝의 표본이었다. 게다가 고급 요리로 분류되던 프렌치 음식을 맛보려면 호텔을 찾아야 했으니 2000년대 초반까지 프렌치의 전성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호텔 다이닝은 고객들에게 특별한 공간이다. 미식의 기능을 넘어 고객들에게 오랜 추억이 서려있는 공간이므로 더욱 특별하다. 70대 노인이 자식에 손주의 손까지 이끌어 오면서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부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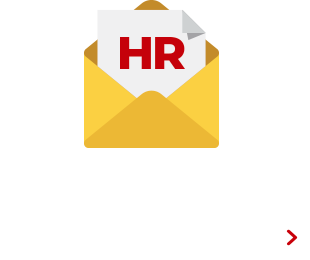 3일 동안 보지 않기
닫기
3일 동안 보지 않기
닫기
 전복선
[전복선의 HOSPITALITY MANAGEMENT IN JAPAN] SNS를 통해 외국인들이 찾는 오지의 호텔, 아오니 온천(ランプの宿 青荷温泉)
전복선
[전복선의 HOSPITALITY MANAGEMENT IN JAPAN] SNS를 통해 외국인들이 찾는 오지의 호텔, 아오니 온천(ランプの宿 青荷温泉)
 정승호
[F&B TREND] 북미 시장 트렌드 ① 아이스티 소비 강국, 미국
정승호
[F&B TREND] 북미 시장 트렌드 ① 아이스티 소비 강국, 미국
 칼럼
[TOURISM COLUMN] 관광교통의 혁신이 필요하다 - 관광의 시각으로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 높여야
칼럼
[TOURISM COLUMN] 관광교통의 혁신이 필요하다 - 관광의 시각으로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 높여야
 최경주
[GLOBAL NETWORKS] 완벽한 웰빙을 꿈꾼다면? 더 웨스틴 리조트 앤 스파 깜란
최경주
[GLOBAL NETWORKS] 완벽한 웰빙을 꿈꾼다면? 더 웨스틴 리조트 앤 스파 깜란
 손진호
[손진호 교수의 와인 Pick] Louis Maurer
손진호
[손진호 교수의 와인 Pick] Louis Maurer
 최성웅
[GLOBAL NETWORKS] 푸꾸옥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최성웅
[GLOBAL NETWORKS] 푸꾸옥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