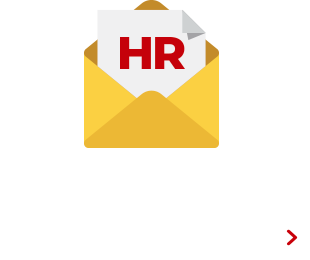지난 여러 해 동안 환대산업에 대해 다양한 기사를 다루고 취재를 해오며 계속해서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가 하나 있다면 환대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면서 이를 창출하는 인력은 어째서 고부가로 취급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관광도, MICE도, 호텔도, 외식도, 모든 서비스의 결과물은 인력으로 시작해 인력으로 완성되고 인력으로 전달된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정의 효율성이 생기긴 했으나 결국 환대산업은 인력이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 원동력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력의 가치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전문성이다. 모든 일에는 각자의 영역과 맡은바 역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를 해내야하는 전문성,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환대산업 종사자들에게만은 그 전문성의 잣대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많다.
지난 잼버리 사태를 보고 그 누가 잘했다 칭찬하겠냐마는 관광산업 종사자로서 이번 잼버리 사태를 지켜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아가 치밀었다. 1000억 원이라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무려 170여 개 국가, 4만 3000명이다. 이 나라는 대체 관광을 어떤 산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 관광이야말로 미래 국가의 성장 동력이라, K-콘텐츠와 K-컬처의 성공으로 마치 관광도 다 된 것처럼 버젓이 ‘K’를 붙이더니 잼버리로 시작해 난데없이 시티투어버스를 태우고, 불국사로 템플스테이를 보냈다가 K-Pop으로 휘뚜루마뚜루 마무리한 세계대회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후문만으로도 꼬리의 꼬리를 무는 에피소드는 그동안 이 나라에서 관광산업이 얼마나 쉬이 여겨졌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여타의 잼버리 조직위원회에는 응당 배치돼 있던 국가별 DMC가 우리 조직위원회에만 없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이 모이는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제행사 기획과 운영, 수습, 그 모든 과정에 있어 전문 인력이 부재했다.
놀고, 먹고 자는 일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그 당연한 행동은 무수히 많은 사람의 치밀한 설계와 기획이 있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그러한 관광의 매커니즘을 몰랐다는 점이, 쉽게 생각했다는 점이, 누가 해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는 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다면 이런 모습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난민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며칠째 씻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고 있어 백방으로 숙소를 수배하고 있는데 관광 프로그램이 추가됐으니 대원들을 긴급히 보내라는 연락에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 듣는 나조차 염증이 나는데 현장에서 이를 하나부터 열까지 지켜본 이들은 어땠을까.
고부가가치의 재원인 전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외래관광객 3000만을 공약으로 내걸고 애먼 K-콘텐츠와 K-컬처까지 휘두르고 있다. 전문성은 인정해주지 못할지언정 사명감을 가지고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관광 자산들에 더 이상 모멸감을 갖게 하는 일만큼은 없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