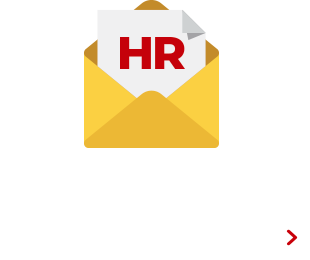“언제 밥 한 번 먹자!” 마무리 멘트로 이만한 인사도 없다. 그 ‘언제’가 성사되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함께 밥 한 끼 먹자는 이는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일까?
얼마 전 취재차 멀리 인천의 끝자락까지 다녀온 일이 있었다. 아침을 못 먹은 터라 취재처에 도착하기 전에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려던 차에 주안역의 토스트가게가 눈에 보였다. 말 그대로 ‘간단한’ 끼니로 때우기에 토스트만한 것이 없어 주저 없이 2000원짜리 토스트를 주문하고 자리를 잡았다. 그냥 평범한 토스트 가게였다. 역에 위치해 있어 길을 떠나거나 떠났다 돌아오는 이들의 요기를 채워주는 곳이었다. 옆에 앉은 사람은 단골인 것 같았고, 단골손님은 사장님과 단조로운 일상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사장님은 가게를 향해 걸어오는 이를 보며 “저기 오는 저 손님은 오면 매번 우유를 꼭 같이 시키더라고. 우유가 있나 확인해봐야겠다.”고 이야기했다. 사장님은 주안역 인근 주민들의 끼니를 해결해주고 있었다.
거창하지 않은 메뉴였지만 사장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남에게 음식을 직접 만들어 대접한다는 것은 준비하는 사람의 정성이 담기는 일이다. 한바탕 싸움으로 데면데면해진 엄마는 화가 나면서도 밥상을 차리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마음에 담아뒀던 일들이 밥과 함께 쓱 내려간다. 밥상이라는 것이 그렇다. 또 밥상을 나눈다는 의미는 어떤가? 내가 쓰고 있던 숟가락을 아무렇지 않게 뚝배기에 넣는 것이 우리나라 밥상문화다. 우리는 밥상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했고,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이들을 ‘식구(食口)’라 이야기한다.
이번 HR 지면을 취재하며 느낀바가 많다. 우리나라는 외식업체가 흔히 하는 말처럼 ‘너무’ 많고,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재료로 만들어진 비슷한 음식들을 배가 고프니까 먹는다. 우리나라 외식은 이렇게 발전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유일하게 외식이 가능했던 주막은 피폐한 삶의 한 줄기 단비와도 같은 공간이었고, 퇴근 후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곁들이는 것이 우리 문화다.
문화는 한 사회의 생활양식 일뿐 그 문화에는 더 낫고 덜한 것은 없었다. 사회가 보다 발전함에 있어 문화는 그것에 발맞춰 갈뿐이다. 하지만 워낙 빠른 우리나라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문화의 보폭은 좁다. 문화는 한 개인이 아닌 집단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 일수도 있다. 비교는 스스로를 먼저 알고 나서야 성립이 가능한 고찰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호시노 리조트 호시노 요시하루 대표는 본지 기고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급과잉과 수요과잉의 주기는 10~15년으로 되풀이되며, 그 부침으로 인해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이야기했다. 지금 외식업은 공급과 수요 사이에서 과도기를 겪고 있는 듯하다. 호시노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이 과도기는 분명 한 단계 나은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는지는 우리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앞만 보고 가다보면 가끔 무엇을 위해 어디로 달리고 있었는지 모호해질 때가 있다. 생계형의 외식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지만 한번쯤 우리 식당이 우리나라 외식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의식주의 식(食)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 세 가지 중 하나다. 없으면 굶어 죽는 것이 음식인데 우리는 음식, 요리에 대한 가치를 너무 업신여겨왔던 것 같다. 주안역의 토스트 가게처럼 돌이켜봤을 때 나를 위한 음식이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 음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