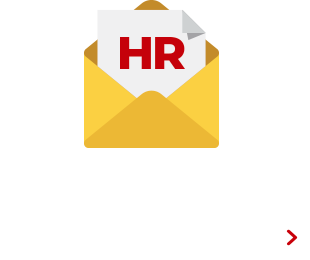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느라 여행의 목마름이 있었던 시기, JTBC에서 방영했던 <갬성캠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랜선 나들이를 가고 싶은 시청자들을 위한 예능이었던 <갬성캠핑>은 국내의 이국적인 장소에서 매회 특색있는 ‘갬성’으로 캠핑을 즐기는 기획이었는데 여행지마다 도시 콘셉트가 정해져 있었다. 한국의 숨은 명소를 찾는다는 시나리오는 한국의 스위스로 남해 양떼목장, 한국의 핀란드로 강원도 정선 하늘길 도롱이연못, 한국의 멕시코로 태안 신두리해안사구 등을 소개했다. 콘셉트에 충실한 출연진들은 해당 지역에 도착할 때마다 “이국적이다.”, “마치 외국에 온 것 같다.”, “한국이 아닌 것 같다.”는 표현으로 캠핑지 감성을 더했는데, 스스로는 덜 몰입이 돼서 그랬는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졌다.
그러고 보면 밖에서 사먹는 밥이 맛있으면 집 밥 같다 이야기하고, 집에서 만든 밥이 맛있으면 밖에서 사먹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우리다. 그래도 이 경우에는 외식과 집 밥이 모두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멋진 풍경을 보고 “집 생각이 난다.”, “한국이 떠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없지 않나 싶다.
전 세계적으로 K-컬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K-콘텐츠, K-푸드, K-뷰티, K-방역 등 여기저기 Korea의 아이덴티티를 붙인 결과, 정부가 2027년 방한외래관광객 3000만 명 유치의 포부를 내걸고 결국 K-관광을 현 정부의 관광 브랜드로 천명했다. 팬데믹으로 무너진 관광산업 생태계 재건이 시급한데 5년 안에 3000만 명이라니. 그래, 숫자야 희망사항이고 포부라 할 수 있으니 그렇다 해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한국문화를 바탕으로 한국관광을 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한국형 칸쿤’과 ‘한국형 디즈니’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부가 더하는 K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K-관광 이전에 한류관광이 있었고, K-푸드 이전에 한식의 세계화가 있었다. 그리고 한류관광과 한식의 세계화는 지속가능성을 잃고 그저 현재와는 관계없는 과거의 일인 양 희미해지던 차였다. 콘텐츠의 활약이 너무도 눈이 부시다보니 콘텐츠의 성공이 마치 모든 K의 성공으로 여겨지는 모양새다.
K-미식벨트를 만들기 전에 벨트를 이어줄 한국의 외식업체들의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한 상황인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K-관광의 핵심인 숙박 인프라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대처인건지, ‘K-컬처 융합 관광’을 지향하면서 넷플릭스와 한류 테마 투어코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외식업 인력난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업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외식업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동료가 없어 일당백으로 뛰고 있는 호텔리어들에게 한국에 오기만을 기다렸던 관광객들을 환대하라고 한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몇이나 들어올지 모르는 해외동포 동료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이대로라면 지속이 불가능하다. 미래를 꿈꾸기 전에 지속불가능성의 현재를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어떤 이유로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지, 그 공허한 구호들이 얄궂게 느껴지는 건 내가 현실에 과몰입하고 있다고 봐야할까, 그들의 몰입이 덜한 것이라고 봐야할까.
뭐가 됐든, K만큼은 지속가능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