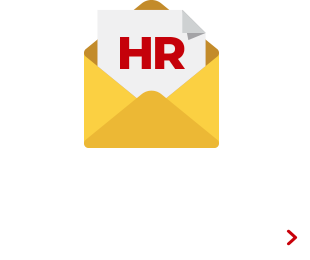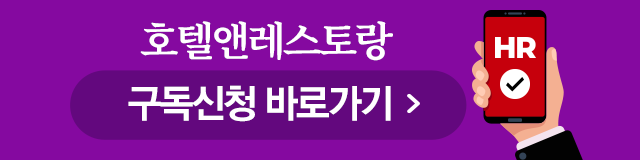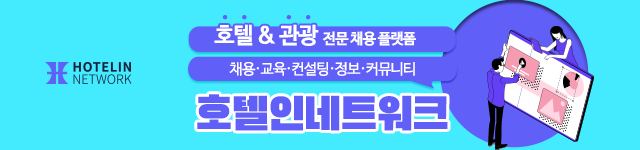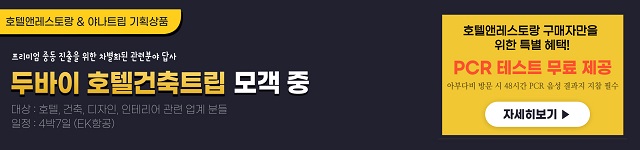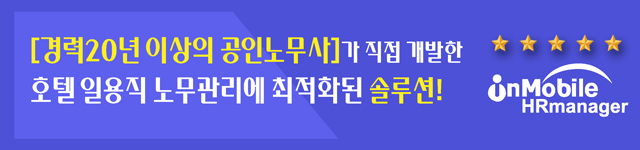2주 전, 필자가 몸담고 있는 호텔 제너럴 매니저의 요청으로 ‘Korean day for staffs’라는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호텔 스텝들에게 한국 요리를 선보이는 행사였다. 외국인들에게 그나마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을 음식이 뭐가 있을까, 많은 고민 끝에 고기와 야채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빔밥을 메뉴로 정했다.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자리다 보니, 꽤 긴장이 됐다. 그러나 흔치 않은 기회라 생각해 오랜 시간동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고, 영원한 나만의 요리사인 엄마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음식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소스-매운 음식을 못 먹는 이를 위한 간장소스, 매운맛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양념 고추장 소스-를 먼저 준비했다.
걱정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달면서도 매콤한 양념 고추장 소스를 매우 흥미로워했다. 한국처럼 각종 나물을 준비하기 어려워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야채 위주로 준비했음에도 호평을 얻었다. 정기적으로 한식의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아직까지 세계에서 한식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외국 음식에 비해 너무 손이 많이 간다는 것, 우리에게는 익숙한 향이나 맛이 외국인들에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점이 한식이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닐까 싶었다.
처음 호주에 왔을 때, 가끔 한식당에 들러 보면 거의 대부분의 손님이 한국 사람이었다. 지금은 현지인들도 절반 가까이 매장을 채울 만큼 특정 한식 메뉴는 꽤 대중화된 것 같다. 다만 너무 한정된 메뉴만 대중화돼 있어 다양성이 좀 떨어져 보여 아쉬웠다. 예를 들어 일식 하면 얼른 스시가 떠오른다. 스시를 기본으로 한 차림은 다양하다. 간단하게 샌드위치처럼 먹을 수 있는 스시 롤, 회전 스시, 5성 호텔의 정통 일식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까지 스시라는 메뉴 하나로 모두 커버가 가능하다.
중국음식 역시 많이 보편화 돼 있다. 중식은 메뉴의 다양성이 하나의 장점으로 부각된다. 특히 얌차나 덤플링의 대중화로 얌차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호텔들이 늘어나고 있다. 워낙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 호텔 측에서도 부담 없이 중식당을 오픈할 수 있기도 하다.
북미나 유럽 쪽에는 한식 파인 다이닝이 여러 군데 있다. 한식과 양식을 혼합한 스타일의 고급스런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주에서의 한식 이미지는 고급스럽다기보다 싸게 먹을 수 있는 푸짐한 음식 이미지가 더 강해 보인다. 한국 음식도 간식부터 정찬까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다. 그러나 이름이나 조리법이 복잡하다보니 외국인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것 같다.
또 다른 이유는 전통 한식 요리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같은 한국인으로서 내 나라 음식임에도 원래 이 음식 맛이 이랬나 싶을 만큼 맛이 천차만별이다. 한식요리사의 실력이 아닌 잠깐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음식들이 대부분이다보니 가끔 외국 친구들이 맛있는 한식당을 추천해 달라 하면 고민이 된다.
한식의 이미지를 높이고 외국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단지 달게만 만들어 한국인조차 먹기 거북한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단지 푸짐한 것뿐 아니라 조금 더 깔끔하고 눈도 즐겁게 만드는 다양한 메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번 한식의 날에 참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 점심시간 3시간 전, ‘한국의 디저트에 대해 알려달라’는 페이스트리 셰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한식 디저트에 대해 지식이 없는 나를 원망했다. 다행히 한국의 다양한 과자를 준비할 수 있어서 많은 호평을 얻었고, 이 일을 계기로 한국 전통 디저트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필자 또한 한식 요리사가 아닌 양식 요리사이긴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한식을 좀 더 사람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봐야겠다. 만일 이 글을 보는 셰프 꿈나무가 있다면, 한식의 기본을 자세히 공부해 볼 것을 권한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김의중
김의중
소피텔 브로드비치
골드코스트 셰프
- 2024.11.05(화)~2024.11.11(월) 투어리즘&마이스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제27대 협회장 후보자 등록 실시
- 2024.10.25(금)~2024.11.07(목) 대회·공모전 "서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찾습니다."…서울특별시관광협회(STA), 2024 서울관광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 2024.10.18(금)~2024.10.19(토) 축제 한국관광공사,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로(路) 페스타’개최
- 2024.10.13(일)~2024.10.20(일) 축제 하슬라국제예술제 오는 13일 개막… 공연장으로 탈바꿈한 강릉 정체성 담긴 장소들
- 2024.10.5(토)~2024.11.3(일) 축제 대한민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 ‘2024 웰컴대학로’ 개최
- [Global Networks_ 중국]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Shenzhen, 深圳(심천)) 2020-01-10
- [Global Networks_ 중국] 유에차이의 본고장 광둥지방 2019-12-29
- [Global Networks_ 호주] 호주를 떠나며 2019-10-07
- [Global Networks_ 호주] Good food & Wine show 2019 2019-09-10
- [Global Networks_ 호주] 모모푸쿠 세이보 in The Star sydney 2019-08-05
- [Global Networks_ 호주] 다양한 퀴진의 천국, The Star Sydney 2019-07-14
- [Global Networks_ 호주] 호주의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2019-05-31
-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그룹, 중화권 포트폴리오 확장 가속화
- 2024-11-12
- 안수진 기자
-

파르나스 호텔 제주, 한국관광공사 주최 ‘2024 중문데이’ 공식 호텔로 참여
- 2024-11-12
- 안수진 기자
-

[Tourism Issue]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을호텔’의 부상과 과제
- 2024-11-12
- 안수진 기자
-

븟컴퍼니-제뉴인그립-어드밴스드, 퀴진, 2세대 셰프테이너들의 지속가능한 활약 지원
- 2024-11-11
- 서현진 기자
-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제8회 김장 담그는 날’ 행사 개최
- 2024-11-11
- 서현진 기자
-

제주항공과 함께 미식의 도시 홍콩으로 떠나자
- 2024-11-11
-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