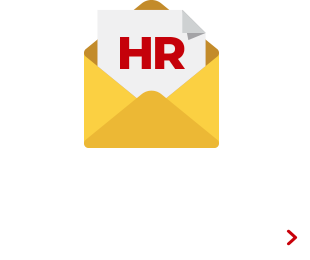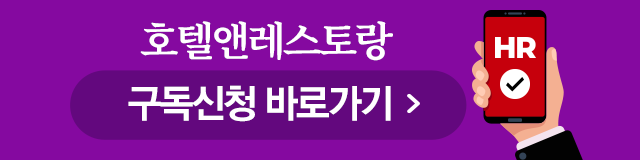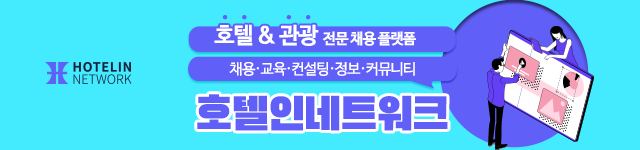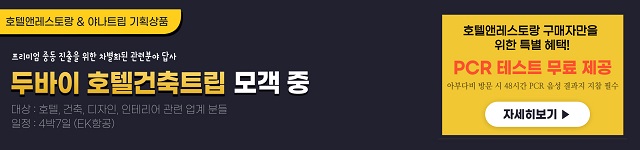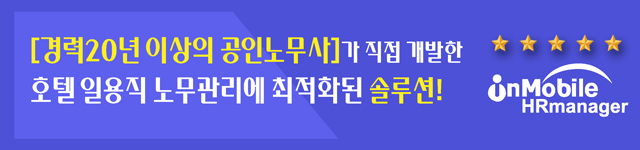주방에서 조리모(이하 ‘모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중요하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모자가 가진 의미는 조리사(이하 ‘셰프’)의 자존심이자 위계질서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자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사진 제공_ 한국조리박물관

예복의 완성은 모자? 셰프 모자의 탄생!
주방에서 모자를 안 쓴 셰프는, 양복을 입고 수영장에 간 꼴이라고 생각한다. 음식에서 머리카락과 같은 이물질이 나오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쓰레기와 같다. 셰프는 음식에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수치로 알아야 한다. 귀찮다는 이유로 모자를 안 쓰면 그 셰프는 유명한 셰프 일지라도 주방 세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겉만 셰프이지 진짜 조리사들이 존경하는 셰프는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요리를 준비함에 있어 모자를 쓴 기록이 회화 속에 남아있다. 조선시대 선조(1609년)가 대신들의 부모를 위해 경수연(慶壽宴)을 마련할 때 모습을 기록한 ‘선묘조제재경수연도’ 속의 조찬소에 남자 요리사들의 모습에서 모자를 안 쓴 사람이 더 드물다. 조선이 모자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모자는 위생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사용하는 모자의 시작은 프랑스로 보고 있으며 ‘토크’라고 불린다. 어원은 ‘등로 모자’로 챙이 있는 모자를 의미한다. 초기의 형태는 나이트 갭(Casque Amache) 또는 스타킹 모자라고 전해진다.
과거 모자와 조리복은 주방에서 일하는 셰프들에게 필수였다. 요즘 미디어 속 셰프들을 보면 모자를 쓴 셰프보다는 모자를 안 쓴 셰프들이 멋있는 요리도 하고 말도 많이 한다. 또한 드라마에서도 셰프 역을 하는 배우들이 모자를 쓴 경우보다 안 쓴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아마도 그편이 대중들에게는 더 멋있어 보여서일 것 같다. 필자는 셰프라면 주방 안에서는 무조건 모자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안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토크 블랑쉬(Torque Balance)의 유래
얼마 전 셰프 뉴스를 보니 모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소개된 것을 봤다. 토그 블랑쉬(흰 모자)에 대한 유래는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본다.
‘토크’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모자는 셰프의 조리복에서 가장 눈에 띄고 독특한 부분이다. 16세기까지의 요리사들은 다 헤진 모자를 썼다고 한다. 영국 헨리 8세 시절에는 식사 중 수프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서 당시 일하던 조리사를 죽이고 그 후로 조리사들은 모두 모자를 쓰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1800년대 중반 프랑스 요리의 창시자로 일컫는 마리 앙투안 카렘(Marie-Antoine Careme, 1783~1833)의 일화도 유명하다.
그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왕들을 위한 요리사로 근무했다. 어느 날 파티에 손님이 희고 긴 모자를 쓰고 온 것을 보고 지금의 조리복을 고안했다고 한다(카렘은 45.72cm 길이의 모자 착용). 그는 흰색의 조리복이 주방이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양면 단추도 그와 그의 직원들이 입으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모자 또한 말단 요리사부터 총주방장까지 직급을 나타내기 위해서 높이가 다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력이 있는 요리사들은 높은 모자를 썼지만 어린 요리사들은 야구모자에 가까운 낮은 모자를 사용했다.
프랑스 현대요리의 아버지 오귀스트 에스코피에(Escoffer) 또한 조리복의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곧 프로정신과 연결된다고 생각했다. 그의 직원들은 일하는 동안 항상 깔끔한 조리복을 입어야 했다. 일하지 않을 때는 코트와 넥타이를 해야 했다. 에스코피에의 개인적인 일화로는 그의 키가 작아서 크게 보이려고 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모자에 들어가 있는 주름이 많을수록 주방에서 지위가 높은 셰프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모자의 높이로만 셰프의 지위를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 호텔에서는 이 모자의 길이가 길수록 직위가 높은 사람인데 솔직히 모자가 길면 주방에서 일하기는 불편하다. 하지만 모자는 조리사 예복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뺄 수가 없다. 단적인 예로 프랑스에는 세계의 유능한 요리사들이 모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토크 블랑쉬(흰 모자)’다. 셰프들의 정신이 담긴 모자의 상징성을 잘 보여준다.
필자도 신라호텔을 그만둘 때 근무 당시 즐겨 쓰던 모자를 집에 가져다 뒀다. 지금도 가끔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한다.
조리인의 역사를 입고, 잇고
필자가 경험한 조리복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글을 마칠까 한다. 요즘 주방에서 입는 조리복의 디자인들은 정말 화려하다. TV에 소개되는 셰프들의 다양한 셰프복을 보면 1975년 여름 워커힐 호텔(당시 관광공사 운영)에 실습을 가서 처음 입어본 것과 대조된다. 그 당시에는 실습생에게 줄 실습복이 없었다. 선배 셰프들도 조리복이 낡아서 구멍이 날 정도로 수급이 어려웠다. 그러니 일반 호텔이나 식당은 오죽했겠나. 필자가 실습 당시 만난 분들을 추억해보면 부장님으로 계셨던 박성수 선생님(한국인 최초로 미국에 국비유학을 가서 요리공부를 하고 반도호텔 총주방장 역임), 그 밑에 과장님으로는김진만 선생님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신라호텔을 퇴직할 때에는 필자가 아껴 입던 조리복에 동료 후배들이 잘 가라고 싸인한 것을 선물로 받아본 기억이 있다. 지금도 나는 호텔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호텔 셰프가 흰옷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 왠지 신뢰감도 가고 마음도 설렌다. 호텔에서 주방 조리복은 좋은 이미지를 남들에게 줄 수 있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학교로 온 후에도 학생들에게 나의 수업을 올 때는 꼭 조리복을 입고 수업을 듣게 한다. 일반적으로 이론 시간에는 조리복을 안 입는데 필자가 외국에 가보니 모두 입고 강의를 듣는 것을 보고 시작하게 됐다. 그와 함께 된 변화로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좋아지고, 조리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아 좋은 교수기법으로 판단된다. 특히 필자는 조리복이 지저분하면 학점에 반영시킨다.
조리사에게 조리복은 작업복이면서 곧 예복이다. 조리복을 입는다는 것은 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해지는 셰프의 긍지와 정신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 정장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최수근 최수근한국조리박물관장/음식평론가 하얏트, 호텔신라에서 셰프를 역임했고, 영남대, 경희대 등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다 2021년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조리·서비스경영학과 교수로 정년했다. 현재 한국조리박물관장과 음식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
- 2024.11.05(화)~2024.11.11(월) 투어리즘&마이스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제27대 협회장 후보자 등록 실시
- 2024.10.25(금)~2024.11.07(목) 대회·공모전 "서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찾습니다."…서울특별시관광협회(STA), 2024 서울관광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 2024.10.18(금)~2024.10.19(토) 축제 한국관광공사,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로(路) 페스타’개최
- 2024.10.13(일)~2024.10.20(일) 축제 하슬라국제예술제 오는 13일 개막… 공연장으로 탈바꿈한 강릉 정체성 담긴 장소들
- 2024.10.5(토)~2024.11.3(일) 축제 대한민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 ‘2024 웰컴대학로’ 개최
-

[전복선의 HOSPITALITY MANAGEMENT IN JAPAN] SNS를 통해 외국인들이 찾는 오지의 호텔, 아오니 온천(ランプの宿 青荷温泉)
- 2024-11-22
- 전복선 칼럼니스트
-

[Global Hospitality] 몽골을 사로잡은 K-프랜차이즈, 그 성공 비결은?
- 2024-11-22
- 서현진 기자
-

제주와 푸꾸옥의 미식 만남, JW 메리어트 제주 X JW 메리어트 푸꾸옥 컬래버레이션 디너 선봬
- 2024-11-21
- 서현진 기자
-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예비 신랑 신부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의 맞춤형 호텔 웨딩 마련
- 2024-11-21
- 서현진 기자
-

[신운철의 세무전략]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지원금,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 2024-11-21
- 신운철 칼럼니스트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예술성과 독창성 돋보이는 2024 페스티브 케이크 13종 출시
- 2024-11-20
-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