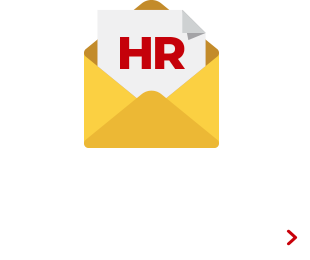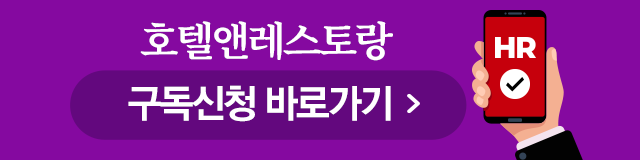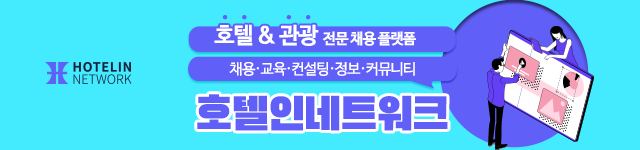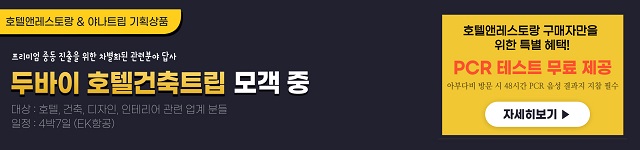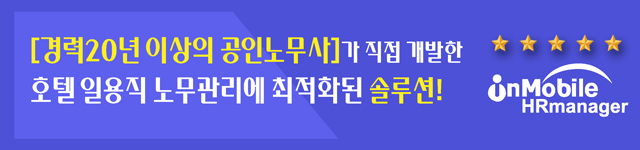*남기엽 변호사가 책을 읽고, 호텔산업의 독자는 남기엽 변호사와 함께 책을 읽습니다. 사람과 접촉하고 상대를 읽어 내 마음을 비우게 하는 호텔산업에서 자아를 채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육체와 두뇌, 나아가 감정까지 저당잡히는 서비스업계에서 포기될 수 없는 책을 소개하고, 함께 읽어나갈 것입니다.

행복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그 자체다.
- 조나단 선즈(Jonathan Sunze)
행복과 목표달성의 상관관계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그 행복의 준거는 내가 느끼는 감정의 연속임에도 가끔 '목표 달성'이라 착각하게 된다.
얼마 전 일이다. 약속이 있었고 난 짐머만의 ‘슈베르트 판타지’를 들으며 평온하게 길을 나섰다. 늦지도 않았다. 음악과 지저귀는 새소리를 벗하며 걷다 저 앞 횡단보도 파란불을 보았다. 본능적으로 뛰었다. 딱히 뛸 이유가 없었는데 뛰기 시작했다. 숨이 찼고 땀이 났다. 가까스로 들어와 노란불 직전 무사히 건너는 성과를 냈지만 옷은 땀에 절었고 숨을 헐떡댔다.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 주는 평온이 깨졌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성과주체로서의 삶은 자기 착취로 평가돼야 하는가’
우리 선조인 고려, 조선 시대의 모든 백성들 삶은 통제됐다. 근대 사회에서도 병원, 군대, 공장으로 이뤄진 푸코의 규율사회는 계속됐다. 그런데 이제 규율사회는 없다. 모두가 자율적으로 주체가 돼 성과를 낸다. 피트니스 클럽, 피아노 학원, 쇼핑몰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고 흑백요리사를 보며 식당에 간다. 성과사회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다.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이러한 자기 경영에 다른 해석을 곁들인다. 성과란, 사회에서 도출된 심리적 질병이라는 것. 규율사회에서 사회 성원은 노동을 강요당했고 그들의 자율적 행위는 부정됐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됐고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성과사회는 다르다. 여기에서 사회 성원은 무엇을 할지 자유롭게 결정하고 수행한다. 성과주체는 강요로부터 자유롭고 누구에게도 정서적으로 예속되어 있지 않으며 스스로 성취한다. 이는 ‘능력’으로 평가되며 ‘자본’으로 환산된다.
그렇다면 강요의 소멸은 자유로 이어질까. 저자는 말한다. 바로 강요와 자유가 일치하는 그 상태에서부터 자기 착취가 시작된다고. 심지어 자기착취는 일방적인 강요보다 더 해롭다. 왜냐하면 자발적 자기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착취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호텔에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자발적으로 일할수록, 이러한 긍정성의 과잉은 자본주의 구조에서 소비되고 착취되며 이 지점에서 착취자와 피착취자는 동일시된다. 이러한 성과사회의 피로문제는 사람들을 개별화하고 고립시킨다.
주체적인 삶의 단편적 해석에 관해
‘피로’라는 키워드로 현대 사회 성원을 성과주체로 파편화해 사회를 진단하는 저자의 접근은 일부는 공감은 된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하다. 가장 큰 한계는 ‘피로’라는 키워드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향상된 의료 및 육체적인 피로를 간과했고, 긍정성의 과잉에만 천착해 부정성의 자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못했다는 점이다. 사회에는 구조마저 전복하는 개인의 성취도 존재하며 이러한 긍정성의 발로는 부정성을 극복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어느 지점에서 긍정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인가이다. 나는, 긍정성의 과잉이 잉태하는 자기착취의 문제보다 긍정성의 표지가 되는 ‘파란불’이 무엇인지를 부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남변호사님, 소장 초안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오늘도 성격 급한, 그러나 인자하신 부장님은 내게 재촉한다. 저 물음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다. 내가 초안을 작성해야 부장님이 검수하고 대표님이 최종 검토해 나가는 시스템에서 행간에 내재된 뜻은 초안을 “빨리” 달라는 것이다. 속도보다 품질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90년대를 강타했다면, 지금은 속도 자체가 품질이다. 퀵 서비스, 로켓 배송, 테마파크 패스트패스 등. 차별화를 표방하는 모든 마케팅 캐치프레이즈엔 속도가 들어간다.
5G도 아직 적응이 안 됐는데 6G 이동통신이 나올 준비를 마쳤고, 유통업은 다음날 배송도 모자라 당일 배송까지 시작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른가’로 귀결되는 속도전능사회에서 품질, 학식, 스타일에 더해 이제는 속도마저 재화가 돼버린 특권 계층의 프리바토피아(Private Utopia)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속도에 지친 나는 가끔 드가의 작품을 보며 위안을 얻는다. 드가는 법과대학에 다니다 진로를 바꿔 발레리나를 여럿 그렸다. 그러나 그는 무대 위의 화려한 발레리나가 아닌 그들의 무대 뒤 날것의 모습을 그렸다. 에드가 드가의 작품 ‘기다림’에서 어느 발레리나는 벤치에 걸터앉아 양말을 고쳐 신는다. 그 옆 중년의 여성은 우산을 든채 생각에 잠겨있다. 온화한 파스텔톤은 그들이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 낭비할 시간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작품 속 둘 모두 서로를 신경쓰지 않는다. 발레리나는 무대에 오르기 전 자세를 잡으며 호흡을 가다듬고 옆의 여성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자신의 생각에 침잠한다. 각자가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기다린다. 그 대상의 접합되지 않는 시선에서 우리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그 지점에서 드가의 그림은 하나를 묻는다.
“나는 정말 나만의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
다시 생각에 잠기기 전으로 돌아가 보자. 횡단보도를 가까스로 건넌 직후인 나에게는 만약 뛰지 않았다면 건너편에서 유유히 음악을 즐기며 여유를 부릴 내 잔상이 보였다. 뛰지 않았다면 난 지금 땀범벅인 채로 걸어가는 대신 저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다시 기다린 뒤 느긋하게 건넜을 것이다.
나는 ‘효율’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목표라 착각하는 파란불의 허상이 우리 인생 도처(到處)에 널려있다는 사실을.
대학입시, 다이어트, 입사, 결혼을 모두가 급히 좇지만 행복의 관문이라던 모든 욕망이 전부 타인에게 학습된 만들어진 사회의 욕구였던 것은 아닐까. 그것이 저자가 피터 한트케의 사유에 의탁해 작위적으로 편집한 피로사회의 한 단면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확실히 해야 하는가.
이에 나는 다시 나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뛰어야 했던 파란불은 무엇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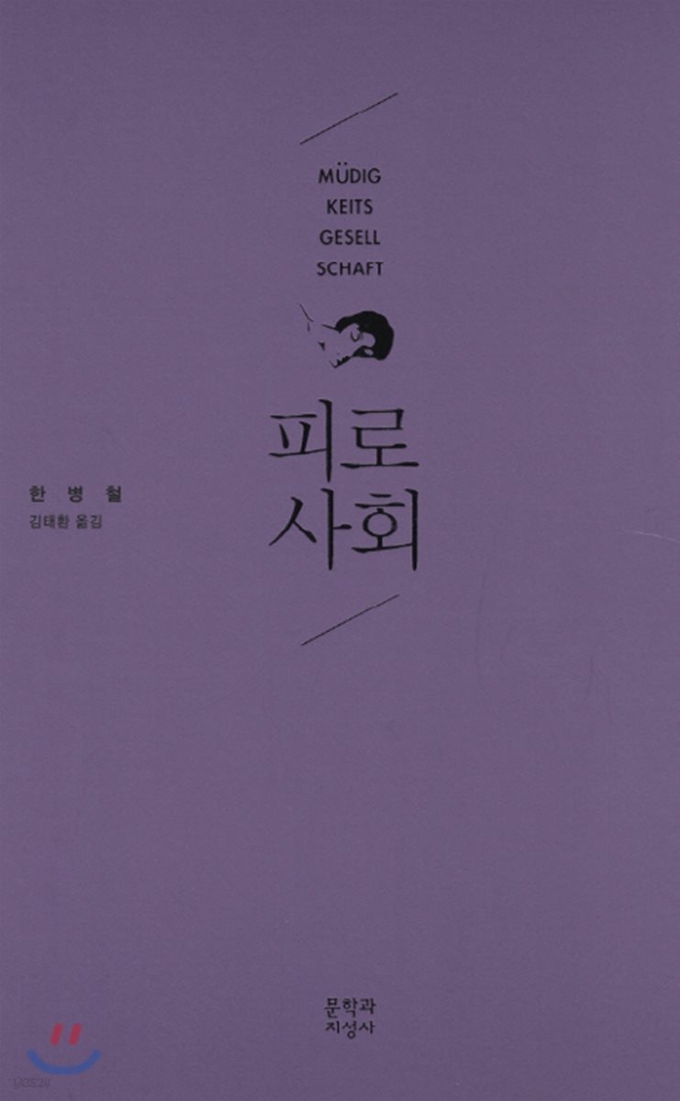

- 2024.11.05(화)~2024.11.11(월) 투어리즘&마이스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제27대 협회장 후보자 등록 실시
- 2024.10.25(금)~2024.11.07(목) 대회·공모전 "서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찾습니다."…서울특별시관광협회(STA), 2024 서울관광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 2024.10.18(금)~2024.10.19(토) 축제 한국관광공사,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로(路) 페스타’개최
- 2024.10.13(일)~2024.10.20(일) 축제 하슬라국제예술제 오는 13일 개막… 공연장으로 탈바꿈한 강릉 정체성 담긴 장소들
- 2024.10.5(토)~2024.11.3(일) 축제 대한민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 ‘2024 웰컴대학로’ 개최
-

[조성연의 SUSTAINABLE HOTEL] 유럽의 지속가능한 호텔 체인, BIO HOTELS
- 2024-11-24
- 조성연 칼럼니스트
-

[강은정의 LUXURY HOTEL] 럭셔리 호텔에서 맞이하는 페스티브 시즌, 외트커 컬렉션의 더 레인즈버러와 르 브리스톨 파리
- 2024-11-23
- 강은정 칼럼니스트
-

파라다이스시티 ‘라 스칼라’, ‘오스피탈리타 이탈리아나’ 인증 획득
- 2024-11-22
- 안수진 기자
-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테이크 어 윈터 패키지로 포근한 연말 선사
- 2024-11-22
- 안수진 기자
-

[전복선의 HOSPITALITY MANAGEMENT IN JAPAN] SNS를 통해 외국인들이 찾는 오지의 호텔, 아오니 온천(ランプの宿 青荷温泉)
- 2024-11-22
- 전복선 칼럼니스트
-

[Global Hospitality] 몽골을 사로잡은 K-프랜차이즈, 그 성공 비결은?
- 2024-11-22
-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