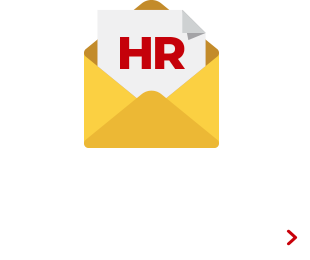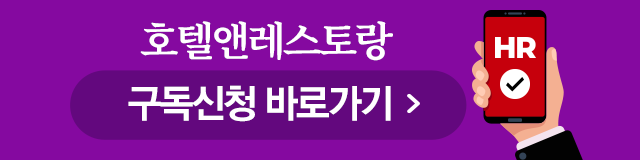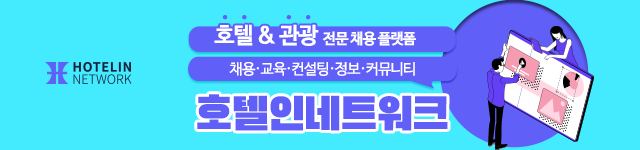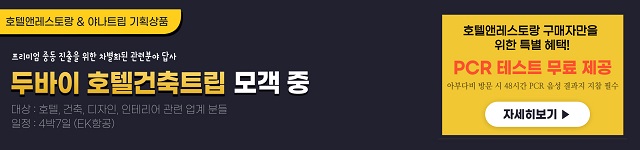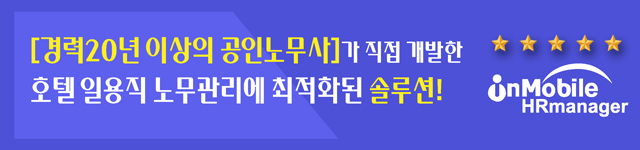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보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타성에 젖어들기 마련이다. 기계처럼 영혼 없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몸에 밴 습관으로 미처 생각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된다. 하다못해 생각과 감정이 없는 물체도 관성이라는 게 있다.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기존의 등속도 운동의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 하는데, 보통 질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물체의 관성이 크다고 한다. 물리적 접근으로 관성이라 불릴 뿐 인간의 타성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변하기를 거부하고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해진 습성, 그리고 타성은 그 나태함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도가 깊어진다.
하는 일이 익숙해지면 가장 둔해지는 것이 통찰력이다. 아무래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다보니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왜 변하고 있는지, 그 변화로 인해 변한 것은 무엇인지, 애초에 변화의 흐름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Hotel DNA 지면을 통해 마케팅과 PR, 세일즈에 대해 연달아 기사를 쓰고 있다. 시리즈를 처음 기획했을 때 코로나19 위기를 기회삼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각 영역의 본질에 다가가 보고자 했다. 물론 한 달여의 취재와 단 몇 페이지의 기사로 한 전문 분야의 본질을 꿰뚫긴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너무 바삐 앞만 보고 뛰어오느라 멈추지 못했던 걸음을 조금이라도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랐던 것 같다.
3개월 간 기사를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시장’과 ‘고객’이란 단어를 쓰는 일이었다. 기업이 시장과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시장과 고객을 상대하는 이들이라면 어쩌면 자신의 이름보다도 많이 들었을 단어일 것이다. 본질적이지만 막연한 단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단어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세일즈 업계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현장의 일이기 때문에 기업의 전략에서는 배제돼 왔고, 가장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영업은 그렇게 생산과 개발, 관리의 영역이 표준화되고 자동화될 때까지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30년 넘은 관성이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외부의 힘을 받아 지금까지의 상태를 지속하지 못하게 됐다. 관록의 세일즈 매니저도 코로나19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다. 관성의 힘이 세면 셀수록 그 충격도 큰 법이다.
호텔은 서비스업이지만 영업을 통해 고객이 호텔에 오지 않는다면 호텔의 서비스는 누구에게도 닿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관계를 맺고, 유유히 흘러오던 시장이 180도 뒤바뀌었다. 하지만 답은 늘 본질에 있다. 그동안 관성에 지배돼 무심코 지나쳐왔던 시장과 고객, 그리고 세일즈가 기업에서 본질적으로 갖고 가야 할 역할에 대한 고민, 코로나19가 내려준 숙제를 하루빨리 호텔들이 풀어내기를 바란다.
- 2024.11.05(화)~2024.11.11(월) 투어리즘&마이스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제27대 협회장 후보자 등록 실시
- 2024.10.25(금)~2024.11.07(목) 대회·공모전 "서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찾습니다."…서울특별시관광협회(STA), 2024 서울관광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 2024.10.18(금)~2024.10.19(토) 축제 한국관광공사,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로(路) 페스타’개최
- 2024.10.13(일)~2024.10.20(일) 축제 하슬라국제예술제 오는 13일 개막… 공연장으로 탈바꿈한 강릉 정체성 담긴 장소들
- 2024.10.5(토)~2024.11.3(일) 축제 대한민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 ‘2024 웰컴대학로’ 개최
-

븟컴퍼니-제뉴인그립-어드밴스드, 퀴진, 2세대 셰프테이너들의 지속가능한 활약 지원
- 2024-11-11
- 서현진 기자
-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제8회 김장 담그는 날’ 행사 개최
- 2024-11-11
- 서현진 기자
-

제주항공과 함께 미식의 도시 홍콩으로 떠나자
- 2024-11-11
- 안수진 기자
-

63레스토랑, 셰프 협업 프로모션 ‘63 셰프 갈라 디너’ 진행
- 2024-11-11
- 안수진 기자
-

어머 이건 사야해!’…MZ세대 홀리는 호텔家 크리스마스 앞두고 특별한 이야기 담은 한정판 굿즈 출시
- 2024-11-11
- 안수진 기자
-

[Special Interview]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열쇠, 한국 의료관광 활성화
- 2024-11-11
-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