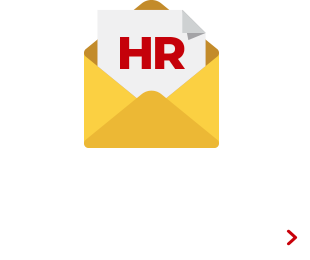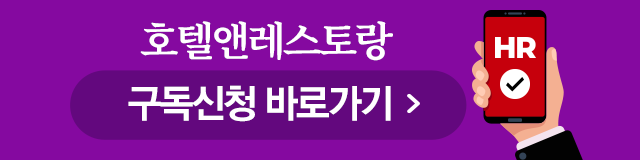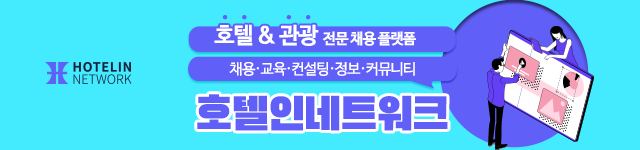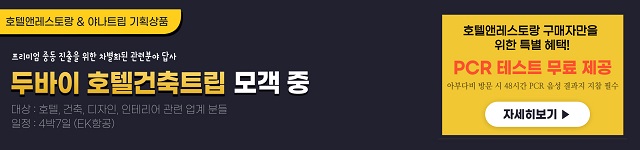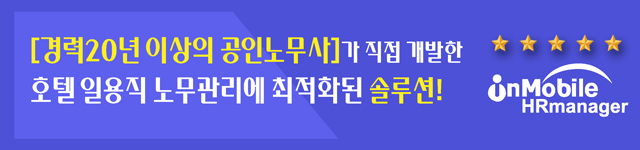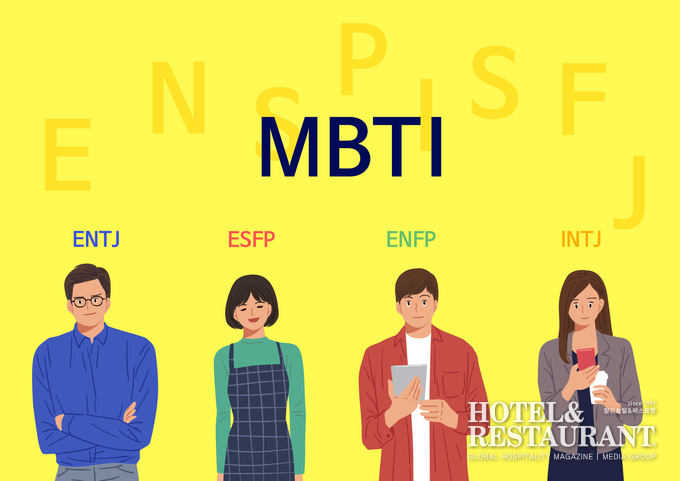
요새 MBTI가 말 그대로 난리다. 기업들은 MZ세대에 소구하기 위한 마케팅 포인트를 MBTI에서 찾고, 심지어 MBTI를 채용에 활용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 구직자의 MBTI 유형을 요구하고, 특정 직무에서는 몇 가지 MBTI 유형을 선호하거나 배제한다는 구인광고까지 내보내고 있다고 한다. 면접에서도 물어보는 MBTI는 이제 상대방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라면 통성명과 동급(?)으로 중요한 화두가 됐다. 약속 장소와 시간 좀 정하자고 하는데 ‘J(Judging, 판단형)’냐고 묻고, ‘E(Extroverted, 외향적)’인데 왜 집에서 쉬는 것을 좋아하느냐고 의아해한다.
옆에서 하도 이야기를 들으니 MBTI가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지, 궁금함을 넘어 요즘 대화에서 MBTI의 활용법에 대해 분석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렇게 내린 결론은 MBTI는 불편한 자기 설명은 피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타인에게 어필하기에 최적(쉽고 빠르고 이리저리 머리 쓰지 않아도 되는)의 도구라는 것이었고, 그로인해 “나는 이런 사람이라 그래.”라는 이야기만큼 많이 들었던 말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못 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취재를 다니다보면 호텔이 아닌 업계, 특히 IT업계 취재원에게 많이 듣는 말이 있다. 밖에서 봤을 때 화려하고 트렌디한 호텔이 막상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변화하는 것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나도 모르게 “호텔이라서 그렇다.”고 순간 대변하게 돼 버리기 일쑤였다.
생각해보면 타 업계에 ‘호텔이라서’만큼 둘러대기 좋은 말도 없는 것 같다. 아마도 그 ‘호텔’이라는 표현 속에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정수를 지향하는, 무언가 범접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고고한 정신이 담겨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허울 좋은 답변이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돼 왔던 국내 호텔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럭셔리 서비스의 부재, 전반적인 서비스 질 하락, 인재의 부족,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ADR 하락, 수익구조 악화 등) 중 어떤 물음에 속 시원한 답변이 됐는지 반문해보고 싶다.
이번 호에 게재되지는 않았지만 8월호 Feature 기사인 ‘관광 DT’에 이어 9월호에 연재할 ‘호텔 DT’를 취재 중에 있다. 4차 산업의 이야기가 나오던 2017년 즈음부터 IoT,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등 여러 차례 노출은 돼 있던 개념이었지만 Digital Transformation의 영역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아직 취재 중인 터라 완벽히 DT를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은 호텔이라서 변하지 못하는 것 같았던 시스템, 프로세스, 서비스들이 호텔이 안 된다고 하는 순간에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MBTI라도 성장배경이나 처해온 환경, 타고난 성향에 따라 어떤 기질이 더 발현되기도, 덜 발현되기도 한다. 고작 16개 카테고리로 한 사람의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둬둘 수 있을까?
호텔도 마찬가지다. DT가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DT의 적용이 호텔 운영에 혁신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본질이라는 미명 아래 변화해야하는 현실을 보기 좋게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이상 현재의 문제에 명쾌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면 고민해볼만한 문제다.
- 2024.11.05(화)~2024.11.11(월) 투어리즘&마이스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제27대 협회장 후보자 등록 실시
- 2024.10.25(금)~2024.11.07(목) 대회·공모전 "서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찾습니다."…서울특별시관광협회(STA), 2024 서울관광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 2024.10.18(금)~2024.10.19(토) 축제 한국관광공사,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로(路) 페스타’개최
- 2024.10.13(일)~2024.10.20(일) 축제 하슬라국제예술제 오는 13일 개막… 공연장으로 탈바꿈한 강릉 정체성 담긴 장소들
- 2024.10.5(토)~2024.11.3(일) 축제 대한민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 ‘2024 웰컴대학로’ 개최
-

븟컴퍼니-제뉴인그립-어드밴스드, 퀴진, 2세대 셰프테이너들의 지속가능한 활약 지원
- 2024-11-11
- 서현진 기자
-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제8회 김장 담그는 날’ 행사 개최
- 2024-11-11
- 서현진 기자
-

제주항공과 함께 미식의 도시 홍콩으로 떠나자
- 2024-11-11
- 안수진 기자
-

63레스토랑, 셰프 협업 프로모션 ‘63 셰프 갈라 디너’ 진행
- 2024-11-11
- 안수진 기자
-

어머 이건 사야해!’…MZ세대 홀리는 호텔家 크리스마스 앞두고 특별한 이야기 담은 한정판 굿즈 출시
- 2024-11-11
- 안수진 기자
-

[Special Interview]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열쇠, 한국 의료관광 활성화
- 2024-11-11
-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