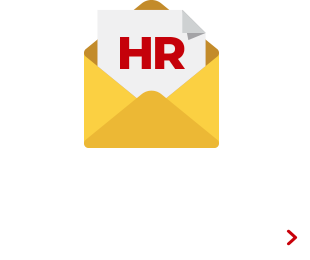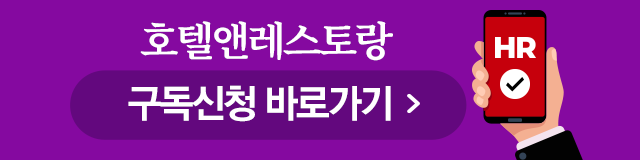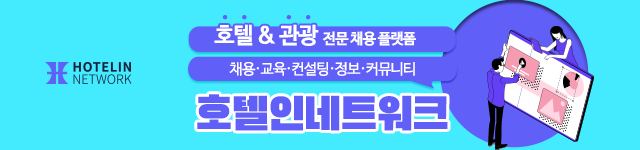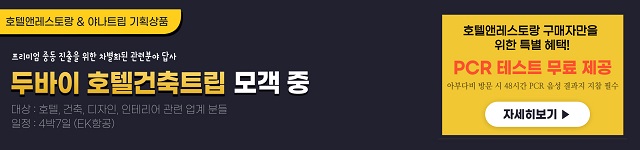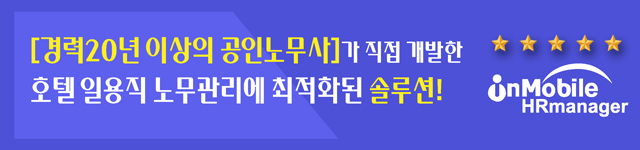지난해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를 얼마나 다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코로나19란 바이러스는 스스로의 존재부터 시작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처음 경험하게 했다. 물론 대부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들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시도해보지 않았을 도전들을 실현케 하면서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호텔의 잠재력을 깨닫게 해주기도 했다. 그렇게 오랜 관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호텔이 이를 탈피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은 매번 인상적이었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이기에 누군가 닦아놓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이들을 뒤쫓으면서 기사를 썼던 것 같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지 않았을 텐데, 매번 어떤 용기 있는 호텔의 움직임으로부터 업계의 첫 시도가 이뤄져, 나비효과처럼 파장을 일으켰다. 그렇게 호텔 사전에 없을 것 같았던 호텔의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켜켜이 쌓이기 시작해 오늘날 호텔의 모습은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다.
선봉장은 일선에서 막중한 임무를 갖고 힘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년이 넘도록 호텔업계의 몇몇 선봉장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맞서기 위해 ‘업계 최초’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그런데 각종 언론에선 선봉장의 임무보다 간신히 내딛은 첫 발에 성공이냐 실패냐의 잣대를 들이밀며 ‘드디어 벼랑 끝’, ‘낮아진 콧대’라는 표현으로 유독 혹독한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 7월 초까지만 해도 잘하면 올해 안에 해외여행이 재개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각종 뉴스에 ‘트래블 버블’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들뜨는 소식들이 들려와 기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얼마가지 못한 채 꺾였고, 수개월간 다자간 협력을 통해 겨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북마리아나 제도와의 트래블 버블에 온 화살이 쏠렸다.
‘이 시국에 여행’, ‘트래블 버블 효과 무색’, ‘흥행저조’, ‘그렇게 난리 치더니’…. 아무리 기대만큼 실망도 큰 법이라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 누구도 쉽게 시도하지 못 했던 것을, 누군가 더 나아갈 다음 단계를 위해 제일 먼저 진을 쳐놨는데 왜 잘잘못을 평가하는 데만 급급한지. 호텔을 비롯해 여행사, 여행업체, 그리고 이들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들도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는 같은 부대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병사일 뿐이다. 부대의 수장인 선봉장을 공격해본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처음이라 당연했을 시행착오다. 중요한 것은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받아들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두 번째 발은 어떻게 내딛을 것인지 전략을 모색하는 일이 돼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했어야 했던 선봉장 역할을 한 이들이다. 혹독한 평가보다 그들의 노고를 헤아리고, 다음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연대가 필요한 때다.
- 2024.11.05(화)~2024.11.11(월) 투어리즘&마이스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제27대 협회장 후보자 등록 실시
- 2024.10.25(금)~2024.11.07(목) 대회·공모전 "서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찾습니다."…서울특별시관광협회(STA), 2024 서울관광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 2024.10.18(금)~2024.10.19(토) 축제 한국관광공사,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로(路) 페스타’개최
- 2024.10.13(일)~2024.10.20(일) 축제 하슬라국제예술제 오는 13일 개막… 공연장으로 탈바꿈한 강릉 정체성 담긴 장소들
- 2024.10.5(토)~2024.11.3(일) 축제 대한민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 ‘2024 웰컴대학로’ 개최
-

제주썬호텔 임직원, 제주 해안 정화 활동 진행
- 2024-11-13
- 안수진 기자
-

"흑백요리사 맛집부터 미쉐린까지"…캐치테이블, 1000여 개 인기 레스토랑 크리스마스 예약 가장 먼저 오픈
- 2024-11-13
- 안수진 기자
-

파크 하얏트 서울의 더 라운지, 딥티크와 페스티브 미식 컬래버레이션 선봬
- 2024-11-13
- 안수진 기자
-

캐치테이블, 1000여 개 인기 레스토랑 크리스마스 예약 가장 먼저 오픈
- 2024-11-13
- 서현진 기자
-

한국컨시어지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 2024-11-13
- 안수진 기자
-

제주관광공사, 2024 제주 웰니스 관광 파일럿 프로그램 "고요한 명상, 제주의 위로" 제공
- 2024-11-13
-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