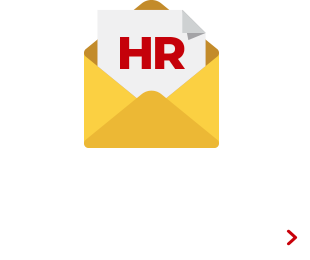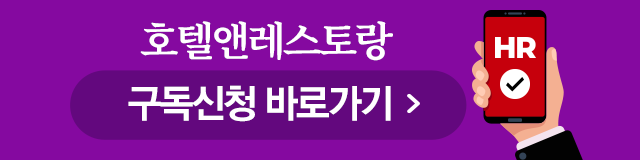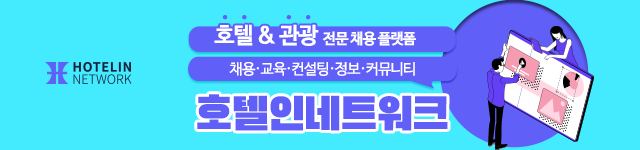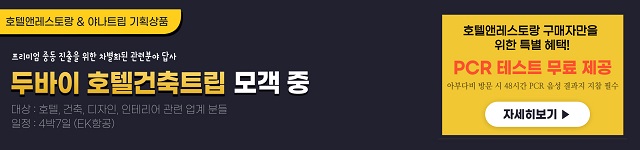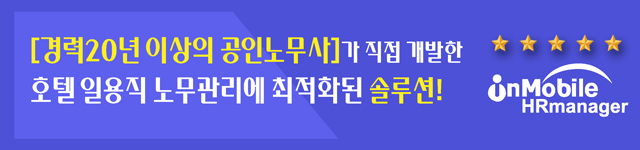‘손님은 왕이다.’ 심심찮게 들을 수 있던 이 말은 인기를 넘어 선풍적으로 한국의 서비스 스탠다드가 돼버린 고객제일주의의 얼굴이다. 또한 호텔, 외식, 관광 등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마케팅 용어로 자주 등장하곤 했다. 겉으로는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요구하지만 정작 내부의 피로도를 높이는 말이다. 하지만 매뉴얼에 강요된 친절은 정직할 수 없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갖춘 호텔과 레스토랑이라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아야 했다. 가만히 손을 들어 서버와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닌 테이블 마다 서버들을 호출하는 벨이 있는 곳도 한국 밖에 없다. 여기요, 저기요 외치며 딩동딩동 울려대는 벨과 종종 걸음으로 테이블을 마중하는 서버들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풍경은 한국의 보통 식당 어느 곳에서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외국의 호텔과 파인다이닝을 경험한 사람들이 인상 깊게 느끼는 한 가지를 지목하면 바로 서비스다. 외모나 태도, 전문적인 교육으로 따지면 한국을 따라갈 곳이 있겠느냐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놓고 보면 느껴지는 서비스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나이나 외모, 인종과 성별을 떠나 그들은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않는다. 이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된다. 미식의 멜팅폿으로 불리는 뉴욕에서 레스토랑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다. 그들은 고객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프렌들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자신도 서비스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 만약 오너가 자신의 명령을 고분고분 따르기를 원한다면 앞치마를 던져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열정을 갖고 일하는 대신 자신들의 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며 이를 침해하는 것을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는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그 삶을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를 명확히 해둔다. 혹자는 이를 두고 마치 천국과도 같다고 말한다. 직원과 고객이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서비스. 고객은 즐기면서도 선을 지킬 수 있는 이상적인 문화를 경험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의 진상 고객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호객을 위한 고객제일주의가 비뚤어진 자화상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떼쓰는 아이의 응석을 받아주다 보면 아이는 커서 자신밖에 모르는 어른으로 자란다.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아야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과한 서비스는 오히려 독이 된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한국적인 서비스는 무엇인가? 정에 기반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고객을 움직이는 것은 진정성이다. 과한 친절은 걷어내고 고객이 원하는 무엇을 파악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 말이다. 더 이상 손님은 왕이 아니다. 고객 역시 자신이 배려받는 만큼 상대방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고객들은 자신이 제공받는 서비스가 지불한 돈에 대한 당연한 권리라는 우월감 대신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준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면 서비스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 2024.11.05(화)~2024.11.11(월) 투어리즘&마이스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제27대 협회장 후보자 등록 실시
- 2024.10.25(금)~2024.11.07(목) 대회·공모전 "서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찾습니다."…서울특별시관광협회(STA), 2024 서울관광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 2024.10.18(금)~2024.10.19(토) 축제 한국관광공사,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로(路) 페스타’개최
- 2024.10.13(일)~2024.10.20(일) 축제 하슬라국제예술제 오는 13일 개막… 공연장으로 탈바꿈한 강릉 정체성 담긴 장소들
- 2024.10.5(토)~2024.11.3(일) 축제 대한민국 대표 공연관광 축제 ‘2024 웰컴대학로’ 개최
-

(사)한국중찬문화교류협회, 시애틀서 한식·K-메디푸드 진수 선뵈
- 2024-11-15
- 서현진 기자
-

[GLOBAL NETWORKS] 푸꾸옥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 2024-11-15
- 최성웅 칼럼니스트
-

그랜드 하얏트 서울, ‘윈터 온 아이스’ 아이스링크 룸 패키지 예약 오픈
- 2024-11-15
- 서현진 기자
-

에그드랍, 태국에 이어 필리핀 최고의 초대형 쇼핑몰에 ‘글로벌 신규 매장’ 오픈 예정
- 2024-11-15
- 호텔앤레스토랑
-

서울시관광협회, 서울 관광숙박업(호텔업) 종사자들의 안전 역량 강화에 앞장선다
- 2024-11-15
- 서현진 기자
-

YTL 호텔, 한국 미디어 및 여행사 파트너 대상 이벤트 개최
- 2024-11-14
-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