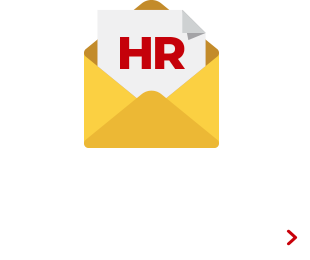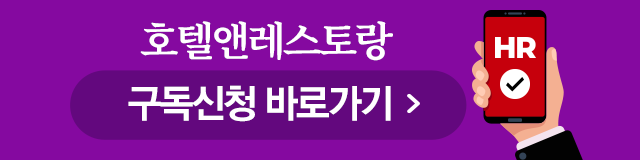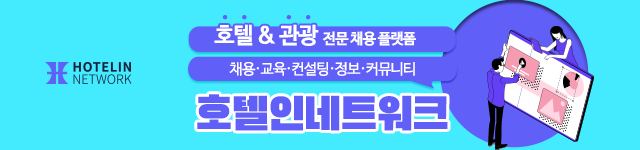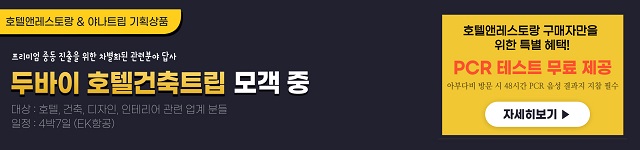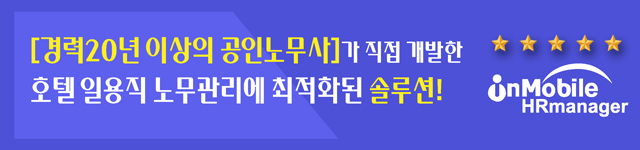40년이다. 무관심 속에 봉사료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온 세월 말이다. 2000년대 초반, 호텔 노사분쟁이 격해지며 봉사료가 쟁점이 됐던 시기도 있었지만 관심보다는 무관심의 세월이 길었다. 무관심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무관심 속에 소비자들은 의미도 모르는 값을 지불했고, 대가를 받아야 하는 이들은 산업의 열악함을 느끼고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 와중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이득을 취했다.
어디로 증발됐는지 모를 봉사료는 무엇을 위해 40년 동안 존재해 왔을까?
이번 이슈지면을 준비하면서 봉사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돌아봤다. 과월 호를 뒤적거리고 있다 보니 당시 호텔업이 한창 성행하고 있었을 때여서 그런지 지금보다 지면의 컬러감은 없지만 내용에는 훨씬 더 역동적인 다채로움이 있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새로운 사안에 적극 개입하는 태도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며 그 무관심이 일부에게 이용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봉사료 존재에 의구심을 품는 기사를 다뤘었는데 잠깐 언급됐다 금세 또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봉사료는 그렇게 아무 조건도, 생각도 없이 ‘그냥’ 있어왔다. 그렇게 직원도 모르는 봉사료의 존재를 계산대에서 알게 된 고객은 오늘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서비스를 되돌아보면서 ‘호텔은 쓸데없이 비싸기만 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안고 호텔을 떠난다. 값이 쓰일 곳을 못 찾았기 때문에 쓸데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손님이 주고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를 서로 모르고 있으니, 그 값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봉사료의 대안으로 ‘팁(Tip)’ 제도를 이야기하지만 팁 문화 도입에 대한 연구도 근래 들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업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으니 연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얼마 전, 우리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과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 앰배서더 아카데미 간의 MOU 협약식이 있었다. 당시 자리에는 없었지만 삼자 간의 협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다.
산업이 현재 고민하는 것을 학계와 연구기관이 인과관계와 현상을 분석,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면 다시 업계는 이를 적용한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때에는 협·단체가 목소리를 내고,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의 싸움을 통해서라도 업계의 고민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를 정리, 보도하는 것이 우리와 같은 매체들이 해야 할 일이다.
봉사료는 오랜 시간 동안 호텔 관련 협·단체들의 골칫덩이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제도. 만약 봉사료가 현업에서 적용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문제제기 했다면, 학계와 연구기관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팁 제도와 이를 도입했을 때 우리 문화와의 간극은 어떤지, 그렇다면 국내 사정에 맞춰 어떤 조율이 필요한지를 연구, 그리고 협·단체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게 어필해야 한다. 산·관·학·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잰걸음으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우리의 무관심 속, 봉사료와 같이 그저 있어온 것들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의문은 우리와 같은 매체를 통해 제기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계속해서 칼럼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업계에 그동안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들,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 귀띔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매체가 해야 할 일이니 말이다.
- 2024.04.22(월)~2024.0517(금) 대회·공모전 서울특별시관광협회(STA), 서울시와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 2024.04.23(화)~2024.05.10(금) 대회·공모전 ‘우리지역 밀착형 지역관광 컨설팅’ 빅데이터로 풀어본다
- 2024.04.15(월)~2024.05.24(수) 대회·공모전 한국관광공사, 2024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공모
- 2024.04.03(수)~2024.05.09(목) 대회·공모전 한국관광공사ㆍ(주)카카오,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 2023.11.30.(목) 대회·공모전 제주감귤박람회, ‘감귤 칵테일 경연대회’ 개최...30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야외 무대에서 본선 진행
-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치유의 명상” 하이원리조트, 힐링 명상 캠프 시범 운영
- 2024-04-19
- 안수진 기자
-

서울특별시관광협회(STA), 서울시와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 2024-04-19
- 서현진 기자
-

[5월호 Visit Society] 한국소믈리에협회 이상준 회장
- 2024-04-19
- 서현진 기자
-

[5월호 Special Forum] 한국 호텔시장에서 로컬호텔로 살아남기, 그 해답은?
- 2024-04-19
- 서현진 기자
-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 ‘필라테스 앤 돈 훌리오 클래스 온 더 루프톱’ 개최
- 2024-04-19
- 서현진 기자
-

호주축산공사, 2024 호주청정우 그랜드 세미나 성료
- 2024-04-19
- 서현진 기자